-
박민규, 「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」깜빡의 서재/책을 읽고 2025. 4. 2. 23:17728x90
※ 짧은 글입니다. 작품 인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, 작품을 읽고 함께 독서 감상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.
※ 생성형 인공지능의 손은 일절 거치지 않은 글입니다. 무단 전재, 배포, AI 학습은 거절합니다.
※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, 감사드립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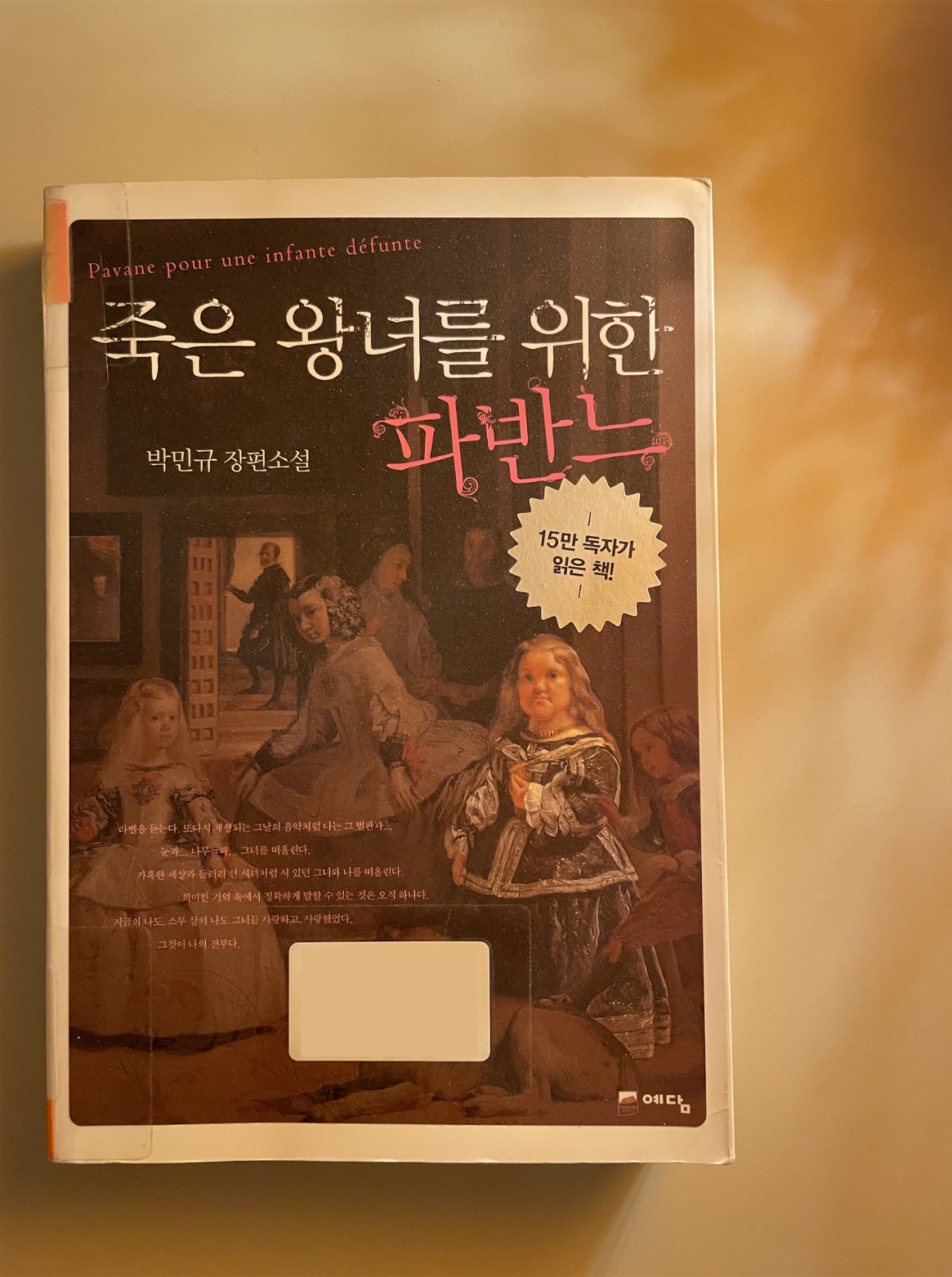
총평
Writer's Cut과
맨 뒷장 CD 보관함을 보고
두 번 놀라는 작품
박민규, 「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」, 애담, 2009
# 이런 분께 추천, 안 추천
로맨스(현실이든 비현실이든) 상황에서 인생철학까지 끄적여보는 분이라면 대추천. 양귀자의 「모순」을 좋아하는 분이라면, 또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는 기회이므로 추천. 음악을 소설과 엮어 읽기를 즐기는 독자라면 추천. 'LP로 듣기 좋은 음악 30선'같은 플레이리스트를 제목만 보고 넘기는 분이라면 안 추천. 클리셰, 가벼운 로맨스를 좋아하는 분께는 안 추천.
# 소설 속 소설 속 소설(?)
개인적으로 작품 맨 뒤 Writer's Cut을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, 오랜만에 표정으로 그 경악을 드러내었다. 프로 감상러들은 이런 충격의 순간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? 속으로 억누를까? 아니면
굳을까?
# 사랑(1)
사랑을 다루는 글들은 왜 이리 다들 가슴이 시릴까.
이루어질 수 없는, 그 서러움이 사랑을 보다 애틋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일까.
글을 읽는 내내 느껴졌던 이 애매모호한 슬픔의 정체가 무엇일까, 속으로 곱씹으며 책장을 덮었다. 이 글이 보다 절절하게 다가왔던 것은, 책의 꽤 많은 부분을 지하철역에서 읽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. 그곳에서 하염없이, 화도 내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기로 선택하였었으므로(슬프게도 이것은 실화이다).
# 사랑(2)
사랑이라는 정서는 외부로 꺼내놓기 두려운 것이면서도, 동시에 감추는 것이 두려우리만치 쉽지 않은 것이다...
뜬금 없지만,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.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서럽고, 또 애틋한 감정이다.
그런 마음은 몇 년이 지나더라도 쉽사리 희석되지 않는,
그러한 것이다.
# '좋다'와 '사랑한다'
좋아함과 사랑함 사이에는, 무너지는 두 빌딩 사이 연결다리만큼의 간극이 있다.
좋아하면 망설이고, 사랑하면 넘는다.
또 하나. 좋아하면 속에서 미소 짓지만, 사랑하면 속에서 미소 짓고 있다고 착각한다.
또또 하나. 좋아하면 강의 신청줄에서 이탈하지 못하지만, 사랑하면 친구 결혼식에서도 뛰쳐나갈 수 있다(슬프게도 이것 또한 실화이다).
전혀 다른 이야기. 좋아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, 사랑함은 배로 두렵고 어려워진다.
그때의 두려움은 애틋함을 배가하는 감정이 아니고…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감정에 가깝다.
이것들이 '나'와 '그녀' 사이의 감정을 '사랑' 외의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라고,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다.
# 시간
소설은 허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텐데, 특히 시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할 때 그 허구성이 두드러진다(이런 감각은 빅터 프랭클의 「죽음의 수용소에서」를 읽고 나서 더 심해졌다...). 너무도 가볍게 내뱉는 2년, 4년, 13년이... 그토록 수많은 것들을 숨겨두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도록 착각시키기 때문이다. 그렇지만 잘 흘러가지 않는 한 순간, 반나절, 하루를 잘 묶어 포착하는 것 또한 소설이다. 그래서 매력적이다.
# 디아스포라
파독 간호사와 광부를 다룬 백수린의 소설을 읽으며, 디아스포라(그러니까 머릿속 사전에 따르면, 이방인 / 떠돌이 / 무국적자[조금 비약] / 다시 이방인)에 대해 독서토론을 한 경험이 있다. 한 장 분량의 발제문을 통해 위의 단어를 살면서 처음 들은 것은 물론이고,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해당 공간으로 떠나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다만 이번 기회에 새롭게 깨달은 것은, 그 미지의 공간인 타국이, 모두에게나 고향의 향수를 풀풀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의 공간은 아니었으리라는 점이다.
# 다시, 사랑
때로 사랑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, 변치 않고 행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. 그 확신이 무너지던 때 나라는 사람도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. 그것을 고수할 수 있는 존재를 아직 제대로 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,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너무도 잘 쓴 소설이며, 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다큐멘터리이다. 이 이중성이 자꾸만 해당 작품을 찾게 되는 원동력은 아닐까 싶다.
'깜빡의 서재 > 책을 읽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김초엽,「므레모사」: 회복의 또다른 이름 (2) 2022.12.25 사뮈엘 베케트, 「고도를 기다리며」: 의미의 기다림 (4) 2021.10.11 「바리데기」: 바리 (5) 2021.10.04 김중혁, 「나는 농담이다」: [오늘의 젊은 작가 12] (4) 2021.09.27 헤르만 헤세, 「크눌프」: 크눌프 (7) 2021.09.20